
국산차의 '클린 디젤' 은 진짜일까?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모든 디젤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이 제도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 검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특정 상표명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 회사 차량을 당연히 검사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가 자동차 업계 전반에 적용될 것을 선언했다.
국내 업계 역시 수입 디젤차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후반부터 아반떼와 디젤, 쏘나타와 그렌저, 모하비 등 디젤 동력 세단 및 SUV를 다수 출시했다. 연료비가 싸고 연비가 높다는 점이 나날이 오르는 유가에 지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는 자체 개발한 클린 디젤 엔진으로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통과했다며 소비자를 안심시켰으나,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터진 이후 이들 기업이 정말로 공해물질 처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높아졌다.
현대와 기아는 이미 배출가스 과대 배출에 대한 전적이 있다. 2012년 투싼과 스포티지에서 에어컨 가동시나 고속구간에서 출력과 가속 응답성 향상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을 축소해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21만 8천대를 리콜한 적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실험실과 실제 도로 간에는 주행 환경이 현격히 달라 차량의 배출가스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폭스바겐 역시 이점에 착안해 배출가스를 저감 하는 눈속임 장치를 장착,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인정 기준(0.08g/㎞)의 2.1배를 초과하는 디젤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제한된 시일 내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거의 모든 승용차와 SUV가 해당되는 중소형차(3.5t 미만)에 대한 새 제도 적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차'급에 대해 2017년 9월까지 실도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과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을 기업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배출가스를 줄이려면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차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정부가 제시한 새 제도에 맞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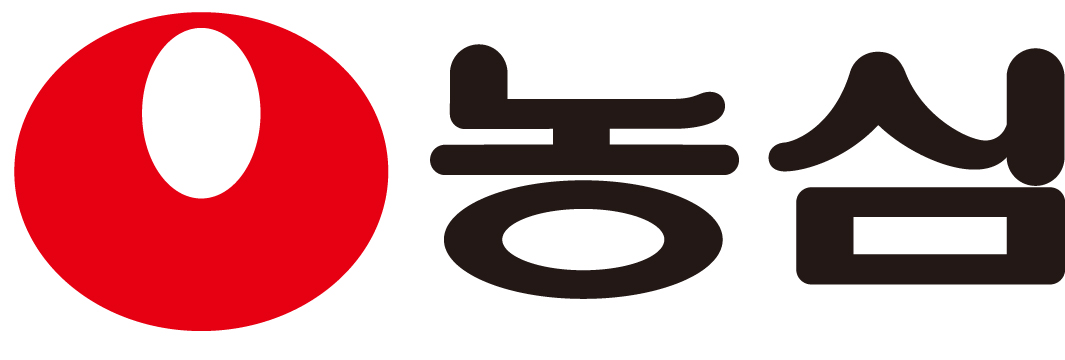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홍형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58/image.png?w=60&h=51)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 성공회 윤종모 주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65/image.jpg?w=60&h=51)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43/image.png?w=60&h=51)
![[자비명상2급 지도자과정에서 강의 중인 범준 스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351/2.jpg?w=60&h=51)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폐자원 순환 협력 협약식 [롯데웰푸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26/hd.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