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에 해조차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으나 흔한 캐럴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불황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고 하고 샐러리맨의 주머니는 가벼워서 손을 질러 넣어도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2016년 12월 말, 며칠이 지나면 해가 바뀌는데도 세월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기조차 어렵다. 아주 쓸쓸하고 음울한 겨울이다.
길거리에는 앙상한 나무들이 찬바람을 온 몸으로 마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플라타나스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넓적한 나뭇잎 몇 개가 바짝 마른 몸매를 유지하느라고 바람에 대롱거리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 보다는 세월의 흐름을 모르는 우둔한 몸짓이 이리석어 보이기만 한다. 여름 한 철 짙은 푸르름으로 길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면 자기소임은 이미 끝이 났는데도 자신의 존재가 아직도 필요한 것으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64%라고 한다. 그러면 3분의 1이 넘는 졸업생들은 그 흔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조차 한자리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힘들게 대학공부까지 시키느라고 고생한 부모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농협 대부금으로 졸업한 졸업생의 앞날은 대부이자만 자꾸 늘어가니 캄캄하기만 하다.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 제대로 하고 학점 따느라고 잠도 잘 자지 못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막상 졸업장을 받고나니 갈 데가 없어, 젊은이는 힘없이 어둑한 밤거리를 정처없이 헤메고 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는 젊은이를 바라보는 옷가게 아주머니의 눈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아침부터 열어 놓은 옷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 저녁 때 팔천원짜리 내의 한 개 팔고는 도대체 옷값을 물어 보는 사람조차 없다. 집에 돌아가는 차비와 점심값도 맞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기가 마음 내키지 않아 자꾸 시간만 잡아먹다보니 어느새 어둠이 물건의 형체를 가리기 시작한다.
옆집 국밥장수 할머니도 국밥을 떠먹는 손목에 힘이 없다. 팔려고 끓여 놓은 국밥이 잘 팔리지 않아 점심에도 자기가 한 그릇 먹고, 저녁에는 옆 이불가게 할머니 한 그릇 주고 마주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의 숟가락질하는 속도는 한여름 늙은 소가 달구지 끄는 속도 보다 더 느리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살 맛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춥고 우울한 겨울이 빨리 지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철에 맞지 않게 앙상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플라타나스 잎들이 깨끗이 다 떨어져 버리고 싱싱하고 푸른 새잎이 힘차게돋아 나는 희망의 새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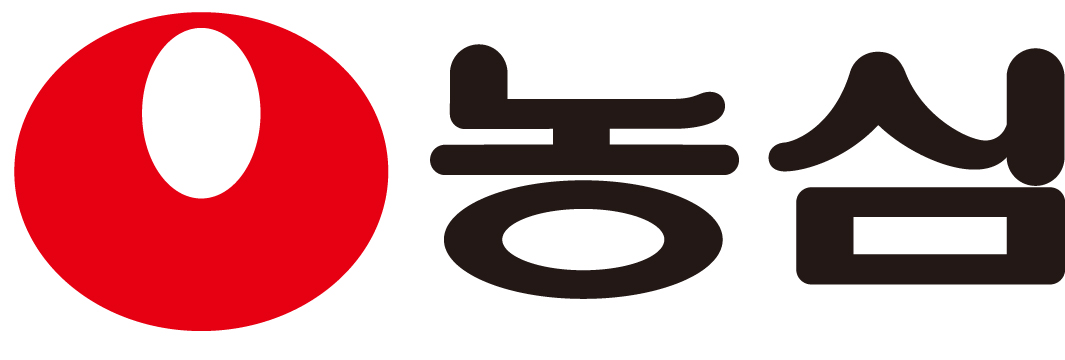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자비명상2급 지도자과정에서 강의 중인 범준 스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351/2.jpg?w=60&h=51)

![[오진국 화백 <황금쟁반> 730cm x 228cm, Mixed Media 2023~2024]](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249/730cm-x-228cm-mixed-media-2023-2024.jpg?w=60&h=51)
![[하버드대 컨퍼런스에 마가스님과 함께한 초청 인사들(사진 부디스튜디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206/image.jpg?w=60&h=51)
![[김지섭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150/image.jpg?w=60&h=51)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폐자원 순환 협력 협약식 [롯데웰푸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26/hd.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