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안전법은 유사 제도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지난달 28일 발효했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KC 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결국 산업부는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은 1년 유예한 채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년 유예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기안전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전기안전법 적용 대상에는 의류 등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들어갔다"며 "다품종 소량·신속 생산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품 안전성 검사는 평균 5일이 걸리는데 이는 '패스트 패션'이 생명인 동대문 상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검사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티셔츠의 경우 KC 인증을 위한 검사료는 평균 1천133원으로, 생산원가(약 3천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박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정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KC 마크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C 인증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박도 나왔다.
서울연구원 문은숙 선임연구위원은 "더 저렴한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량·맞춤형 생산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소비자 용품에 쓰는 화학물질이 소량이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등록절차를 면제해주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문 위원은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일반제품안전법'(GPSD)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으로 ▲ 안전한 제품 출시 ▲ 소비자에 대한 제품 관련 제반 위험 정보 제공 ▲ 유해 제품에 대한 추적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핵심이자 소비자가 기대하는 전기안전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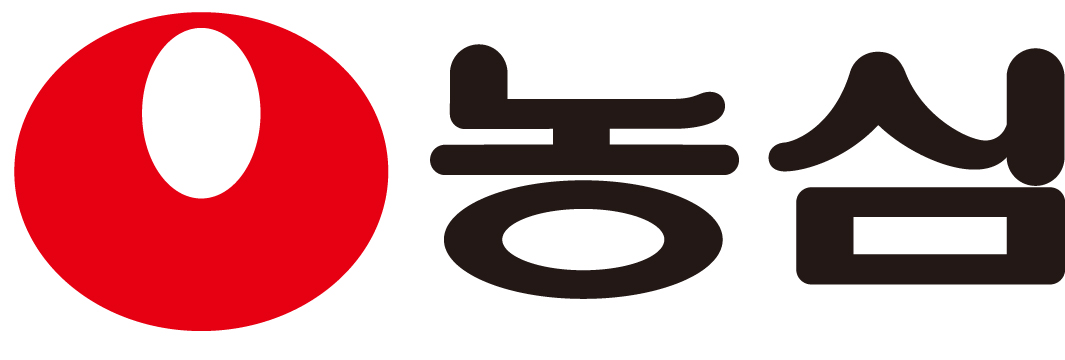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홍형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58/image.png?w=60&h=51)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 성공회 윤종모 주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65/image.jpg?w=60&h=51)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43/image.png?w=60&h=51)
![[자비명상2급 지도자과정에서 강의 중인 범준 스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351/2.jpg?w=60&h=51)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폐자원 순환 협력 협약식 [롯데웰푸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26/hd.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