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 푸드트럭이 탁상행정으로 인해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서둘러 개정하면서 '청년창업과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추진해온 푸드트럭은 그러나 '2천대 이상 창업·6천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당초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여려가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욱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등록 푸드트럭은 전국에 316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가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하면서 기대했던 '2천 대 이상 창업'과는 큰 차이가 난다.
푸드트럭은 지역별 편차도 크다.
경기(98대)·서울(30대)·인천(20대) 등 수도권이 전국 푸드트럭의 절반 가까운 148대(46.8%)를 차지하고, 경상권이 110대(34.8%), 호남·제주권과 충청·강원권이 각각 29대(9.1%)를 나타낸다.
충남(9대), 전북(7대), 전남·제주(각 5대), 충북(3대), 대전·세종(각 1대)은 푸드트럭 운영 대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구조가 변경된 푸드트럭은 전국에 1천409대이지만, 이 가운데 22.4%만 실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의 70%는 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푸드트럭 창업이 저조한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지역이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강가,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을 영업장소로 희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선정해 모집공고를 하는 곳은 손님 끌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푸드트럭 창업자의 영업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이후 영업 중인 푸드트럭 가운데 11곳을 골라 영업컨설팅을 한 결과 평균 투자비는 2천480만원이었다.
1천2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200만 원까지 투자했지만, 월평균 매출액은 523만 원, 월평균 수익은 176만 원에 그쳤다.
아직 푸드트럭으로 '대박이 났다'고 알려진 곳은 없다. 오히려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사업을 접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충북 제천의 50대 여성은 정부가 푸드트럭을 허용한 이후 2개월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푸드트럭 2대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천 의림지에서 어묵과 떡볶이, 솜사탕을 팔았지만, 6개월 만에 폐업했다.
지금은 이동영업이 허용됐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행위를 할 수 있어서 수지를 맞추기 어려웠다.
올해 1월에 313대였던 전국의 푸드트럭 운영 대수는 2월에 4대가 늘었지만, 서울과 경기, 대전지역의 푸드트럭 5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곳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260명의 푸드트럭 운영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의 김수인(43·여) 이사장은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이미 상권이 형성된 곳을 빼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주고 있다"면서 "기존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하면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푸드트럭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자가 트렌드에 맞춰 품목을 정해 승부를 거는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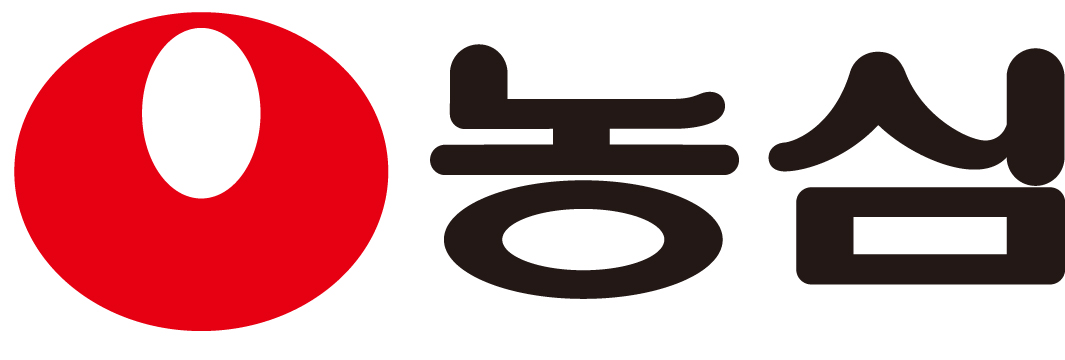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전진규 작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506/image.jpg?w=60&h=51)
![[홍형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58/image.png?w=60&h=51)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 성공회 윤종모 주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65/image.jpg?w=60&h=51)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43/image.png?w=60&h=51)







![LG유플러스의 AI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LG유플러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504/lg-ai-lg.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