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나그네가 되니 이름하여 여름 나그네라고 할까?
나는 여름 나그네가 되기를 좋아 한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닫는 대로 그냥 떠나는 것으로 좋아한다. 아마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를 참기 어려워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나 혼자 떠날 때는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몇 권의 책, 서예도구 등 챙겨야 할 것을 고르다 보면 짐이 제법 많다. 차를 가지고 갈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 대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짐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나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달랑 칫솔 하나들고 집을 나서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낭만주의자의 멋으로 todr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나의 아내는 같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이나 혹시 필요할 지도 모를 것 까지 주워 담아 짐의 부패와 무게가 상당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7월 초 부산에서 중학교 동기 9집 부부가 2박 3일 여행을 하는 모임이 있었다.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다시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경주로 이동하는 일정이 잡히게 되었다. 나는 평소습관대로 작은 가방 하나씩 달랑 들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집사람은 이 것 저 것 챙기고 옷도 더울 때, 장마철이라 비올 때 것 챙기고 우산까지 준비하니 제법 큰 가방에 작은 가방까지 생기게 되었다. “겨우 사나흘 여행하는데 무슨 짐이 이리 많은가”라고 투덜거렸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단출하게 떠나야지”라고 한마디 더 하니 아내는 그만 “같이 가기 싫으면 집에 쉬세요”라고 한다. 기가 찼지만 제법 무거운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름 나그네는 그저 작은 손가방하나 들고 훌쩍 떠나는 것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부산에 도착하니 날씨가 쾌청하여 우산이나 옷가지들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집사람에게 “여름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멋이 있는 것”이라고 한방 먹였다. 그러나 다음 날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 바닷가로 나갔는데 그만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다. 모두가 물에 젖은 생쥐 꼴이 되었다. 숙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니 집사람이 “보세요, 사람은 준비성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라고 한 마디 하고 만다. 다른 친구들은 빗속을 걸어야 하는데 우산이 없어 쩔쩔 매는데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커다란 우산 두 개를 각자 들고 여유롭게 숲속으로 걸어 갈 수 있었다. 울산 친구 농장에서는 푹푹치는 더위에 농장을 둘러보느라 온 몸이 물이 되었다. 당연히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 기분이 상쾌하였다.
여름 나그네는 가벼운 차림으로 손을 휘휘 저어며 떠나는 것이 멋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았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단순한 낭만주의 보다 좀 짐이 되기는 하지만 집사람이 추구하는 실용주의가 빛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옳은 것은 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름나그네가 되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낭만주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 실용주의와 거리가 먼 감성적 낭만주의는 잘못하면 정치경제적으로 적지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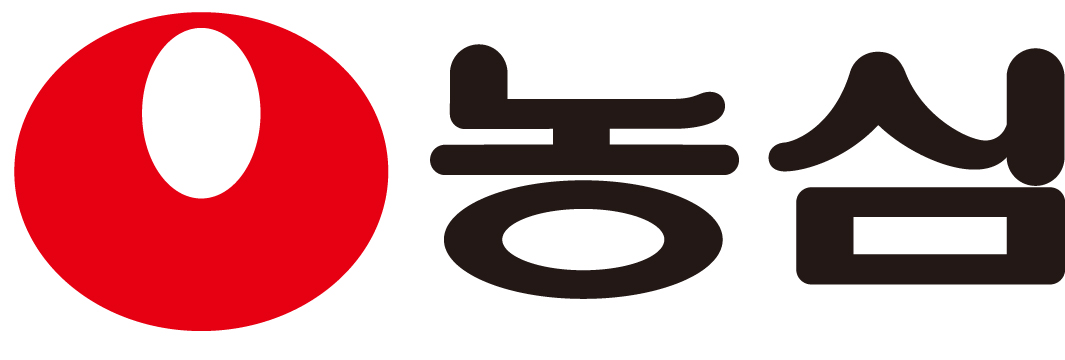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43/image.png?w=60&h=51)
![[자비명상2급 지도자과정에서 강의 중인 범준 스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351/2.jpg?w=60&h=51)

![[오진국 화백 <황금쟁반> 730cm x 228cm, Mixed Media 2023~2024]](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249/730cm-x-228cm-mixed-media-2023-2024.jpg?w=60&h=51)
![[하버드대 컨퍼런스에 마가스님과 함께한 초청 인사들(사진 부디스튜디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206/image.jpg?w=60&h=51)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폐자원 순환 협력 협약식 [롯데웰푸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26/hd.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