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 개시연령 등 연금개혁 쟁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기금 소진되면, 2080년엔 보험료율 35% 돼야 연금지급액 충당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천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된 탓에 현재는 '10년 이상 납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44.0%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급속도로 늘게 된다.
이 때문에 204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해 15년 후인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추계의 결과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을 2041년(1천778조원), 수지적자 시점을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던 4차 재정계산 때와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점과 고갈 시점 사이 기간이 16년에서 15년으로 줄어 하락폭이 조금 더 가팔라졌다. 다만 고갈 시점의 '마이너스' 규모는 124조원에서 47조원으로 줄었다.

▲ 연금개혁 쟁점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혁 논의는 '더 낼지'(보험료율), '더 받을지'(소득대체율), '더 늦게 받을지'(수급 개시연령) 등 수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용돈 수준의 낮은 급여 수준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을 끌어올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개혁의 방점을 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 재설정, 저소득 노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의 도입,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기존 연금체계의 '판'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혁 논의의 두 축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대 초반인 명목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이 중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연금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는 이달 초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인상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는데,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기금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일정 시점이 지나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보장성)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데, 올해는 42.5%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세대 간 형평성' 혹은 '후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다가올 재정 위기를 미리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강화란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속 불가능한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더욱 왜곡·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측은 재정 위기론이 과장돼있으니 연금의 보장성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38.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3배에 육박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반면 연금의 보장성은 낮고 사각지대는 넓다는 지적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40%대 초반이지만, 짧은 가입기간(평균 18.7년)으로 인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로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정규직 87.5%로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37.9%에 불과하다.
남찬섭 동아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재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장성을 낮추는 것은 공적연금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안정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연금 민영화라는 남미의 실패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놓고는 올해 만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개혁 방안으로 거론된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늦춰질 전망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받고, 더 늦게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이달 초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위원들 사이에서)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절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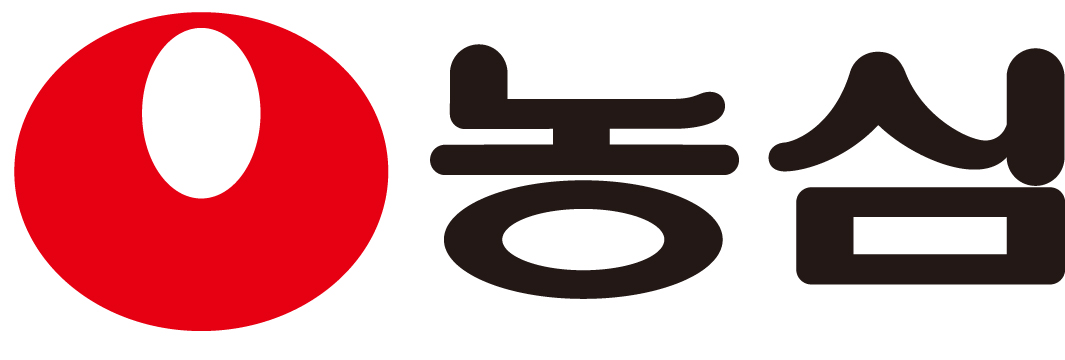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홍형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58/image.png?w=60&h=51)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 성공회 윤종모 주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65/image.jpg?w=60&h=51)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43/image.png?w=60&h=51)
![[자비명상2급 지도자과정에서 강의 중인 범준 스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351/2.jpg?w=60&h=51)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폐자원 순환 협력 협약식 [롯데웰푸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26/hd.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