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좋다고 끝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정치가들이 선거에 승리하여 영광스런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푸른빛으로 보이고 세상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귀도 따라올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다. 유교권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런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국 후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근래 까지 적지 않은 정치가들이 이런 길을 밟아 왔다. 특히 정부주도로 고속성장을 하던 시대에는 부귀공명이 정치적 공권력 하나에 붙어 다닌 것이 비일비재하였다.
대통령들은 공권력의 크기가 큰 만큼 등장은 화려하였다. 그리고 재임 중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공권력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작이 화려한 만큼 끝이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는 대개 개인적 회한과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들의 불법 및 투옥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시작이 아름다운 장미빛으로 장식되어 있음에 비하여 끝은 음울한 잿빛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공권력의 시작과 종말은 왜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력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사회문화적 권력이 한 뭉치로 붙어 다녔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장악한 사람도 권력의 융합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까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돈과 명예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들의 이런 인식은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이 대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평생 동안 행사가 있으면 앞자리 앉고 대접을 잘 받으면서 귀인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숱하게 보아 온 데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인들의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권력의 본질과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흔히 권불10년이라고 하듯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특히 선거직 공권력은 그 임기가 법률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 공권력의 행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반작용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이나 선지자들은 통치권자들에게 자신이 지닌 권력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다. 도덕정치에서는 덕을 숭상하고 법치주의에서는 법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항상 사회정의와 국리민복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익 대신에 사익을 우선하고, 국민대신에 특정 사인을 중시한 대통령이 어떤 말로를 맞이하였는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아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멀리한 박대통령은 그 말로가 처참하기 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시민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국회는 결국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299명중 무려 234명이 찬성을 한 것이다. 결국 박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나아가 피의자로서 특검을 받게 되어 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본질과 속성을 잘 알지 못한 대통령의 슬픈 종말이 이 당에 또 한 번 재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언제쯤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는 통치권자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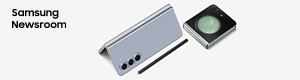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소프라노 인수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42/image.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4/image.jpg?w=60&h=51)
![[2024 한국특성화고총동문연합회 총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3/2024.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 미고사 21일 노트를 나눠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자비나눔 행사 진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0/21.jpg?w=60&h=51)


![건물 [무료이미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4653/image.jpg?w=288&h=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