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이다.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도주차량’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로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는 법률상 특정범죄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부상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사고는 대인사고, 대물사고,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 피해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차량만 손괴하고 그냥 가버리면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고 이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한편, 대법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인해 건강상태를 침해당했다고 보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인 ‘다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의 상해진단이 비록 1~2주로 경미하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실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가해자는 뺑소니로 처벌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절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를 확인하여 119 신고를 통해 구호조치를 신속히 하고 이와 동시에 112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안 다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조치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도 되겠지?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부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당해 운전자는 뺑소니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 운전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대신 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이때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해야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 만일, 구호조치를 제3자에게 시키면서 그 사람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가 추후 발각되었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할 정도가 아닐 정도의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근처 약국에 함께 가서 자양강장제라도 한 병 사서 먹인 후 그 영수증을 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때 가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장영 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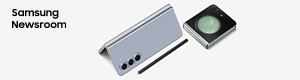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소프라노 인수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42/image.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4/image.jpg?w=60&h=51)
![[2024 한국특성화고총동문연합회 총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3/2024.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 미고사 21일 노트를 나눠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자비나눔 행사 진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0/21.jpg?w=60&h=51)


![건물 [무료이미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4653/image.jpg?w=288&h=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