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의 가계부채는 무려 1,344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부채의 증가속도 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구조문제이다.
지난해 부채위험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여신규제를 하였으나 141조원이 증가하고 말았다. 지난해 가계신용증가율이 11.7%로 이는 2014년의 6.5%, 2015년의 10.9%보다 높은 것으로 부채증가속도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결과라고 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세 달만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4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가계부채규모와 비슷하다. 이렇게 박근혜정부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정책 영향이 적지 않다. 최경환부총리는 한 때 경기부양을 한다는 명목아래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라”고 국민들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런 정책흐름을 타고 부동산업자들은 수년간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과잉공급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밀어내기씩 분양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가계부채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여신규제를 하자 주택구입자들은 제2금융권을 몰리기 시작하였다. 여신심사강화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부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귀착되어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정부의 금리인상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리 대출금리가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가계부도, 내수위축 등을 통하여 우리경제는 일시에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차기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학계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내어놓기도 한다. 지금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 등 구조개선방안 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든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저성장 탈출정책, 일자리 증가대책 등 주요정책이슈와 더불어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을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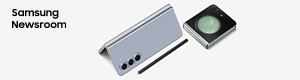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소프라노 인수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42/image.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4/image.jpg?w=60&h=51)
![[2024 한국특성화고총동문연합회 총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3/2024.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 미고사 21일 노트를 나눠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자비나눔 행사 진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0/21.jpg?w=60&h=51)







![테라파워의 4세대 SMR '소듐냉각고속로' 조감도 [HD현대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548/4-smr-hd.pn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