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고금리 수신전략으로 시장교란·역마진 논란을 일으키며 은행권을 뒤흔들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다이렉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온라인 상품인 다이렉트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수시입출금예금을 출시했는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월등하게 높아 현재까지 무려 8조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그만큼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 때문에 국책은행이 국가신용등급에 따른 낮은 조달금리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이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 상품이라고 봤다. 관리업무 비용을 잘못 산정한데다, 상품으로 모은 예수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창업 대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산업은행이 그간 고금리로 모은 자금을 어떻게 굴리느냐다.
산업은행은 이달 안에 다이렉트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영화 준비는 차치하더라도, 다이렉트 상품으로 모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 및 수익을 내기 위해 소매여신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이렉트 신용대출은 다이렉트 예금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보다 좋은(낮은) 금리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의 수익이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산업은행이 수신확대를 위해 고금리를 내세웠듯이 여신확대를 위해 저금리를 제시한다면 은행 간 대출경쟁이 심화되고,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빨리 망하는 것이 나은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 은행 고객을 뺏아와야 하는데, 그 은행 역시 고객을 안 뺏기고자 하고, 그래서 잠재부실요인이 있는 대출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다이렉트 대출의 주요 고객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도 지난해 다이렉트 예금을 통한 수신 자금을 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저리 대출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이같은 대출은 취지 면에서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을 정도로 손실의 부담책임이 크고, 자칫하면 '혈세'로 메워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출만 보더라도 만기때 원금상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달 소장은 "정상적으로 대출 1000억원이고 ROA(총자산이익률)가 0.5%면 순이익이 5억원이다. 은행이 5억원의 수익을 더 내려면 1000억원의 정상적 대출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1%인 10억원이 부실나면 이익은 4억9500만원, 손실은 10억원이라 5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난다. 또 10억원의 손실을 보전하려면 1년만기 건전한 대출 2000억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은행 경영의 핵심이다"며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보증대출만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부실작성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황영기 前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다가 남긴 오점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대출자산이 두배가 늘었다. 하지만 부실대출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난 4년반동안 11조원의 대손비용을 썼고, 은행들 중 자산건전성이 제일 취약하다"며 "그동안 제한된 사업범위 내에서 무리한 자산확대 경쟁은 쏠림현상으로 연결됐으며, 이후 시차를 두고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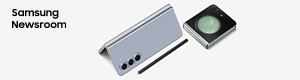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어린이 행복도시, 서울’ 퍼포먼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39/image.jpg?w=60&h=51)
![[왼쪽부터 이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공동위원장(전 관광공사사장) ,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상임위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대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46/1-1.jpg?w=60&h=51)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부도를 덮었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석가모니 가사를 벗기면서 제막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76/image.jpg?w=60&h=51)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워크숍, 안성굴암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29/image.jpg?w=60&h=51)
![[KOREA NEW WAVE 7, 벨기에에 펼치는 K-Art의 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99/korea-new-wave-7-k-art.jpg?w=60&h=51)







![CJ제일제당 사옥 [CJ제일제당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255/cj-cj.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