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해11월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보다 많고, 올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보더라도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회경제적 뒷자리로 물러나다보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48%로 가난한사람이 많고 고독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회의 눈초리도 따뜻하지가 않다.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운전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기피하고 카페에 들어가려고 해도 노인이 있으면 분위기를 흐려 장사가 잘 안된다고 달가와하지 않는다. 심지어 집에서 조차 자식들이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구박을 주기 까지 한다. 그야말로 노인이 슬픈 나라이다.
어제 명예교수 40여명이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모 대학의 대학원장을 지낸 한학자 한 분이 자신이 최근 에 쓴 책 “풀어 쓴 효경”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책의 내용과 집필동기를 말하면서 문대통령에게 노모를 청와대로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도록 권유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이 7,80대의 은퇴한 교수들은 얼굴표정으로 보아 동감을 표하기 보다는 당혹스런 느낌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도리로 보아서는 맞는 말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듯하였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부모가 건강하면 따로 살고 편찮게 되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새삼스럽게 효도를 강조하고 그 도리를 밝힌 ‘효경’이라는 책을 써 본들 누가 읽어볼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선물 받고도 효도를 받아야 할 노학자들조차 기쁜 내색을 지니지 못하니 저자의 노력과 성의가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이제 노인들조차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을 생각하면 인, 의, 예, 지가 소홀히 여겨지고 노인들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독을 치유해줄 수 없는 사회제도와 풍토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재앙이다. 노인들의 자율적 노후대책과 더불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럽식의 사회복지제도와 전통적 노인공경풍토의 회복이 아쉽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살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이런 느낌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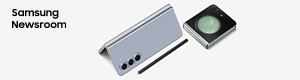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소프라노 인수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42/image.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4/image.jpg?w=60&h=51)
![[2024 한국특성화고총동문연합회 총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3/2024.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 미고사 21일 노트를 나눠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자비나눔 행사 진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0/21.jpg?w=60&h=51)







![차세대 청사진 사례인 서울 마포 중부변전소 [한국전력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51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