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로나19로 도입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최근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에 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도입된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아동 세액공제 등 미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대부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까지 정부 부양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그 증대 효과가 2%포인트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준이 꽤 크게 후퇴했다"라며 "다른 요인들이 이를 상쇄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가정이지만 여기엔 씨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로버트 덴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 축소에 따른 충격이 GDP의 2.5∼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 지난해 말 기준 2조4천억달러(약 2천873조원)에 달하는 초과저축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런 막대한 초과저축이 예상만큼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미 의원들은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시장분석업체인 에버코어ISI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아동세액공제 등으로 지난해 미국 가계가 약 1조달러(약 1천197조원)를 받았고 이 중 25∼30%가량이 자동차, 가스, 외식업 등을 제외한 소매유통 판매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산업 분야의 매출이 2천500억∼3천억달러(약 299조3천억∼359조2천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축소로 소매 판매의 명목 성장률이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여전한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것은 고용시장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라고 이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정책으로 선회를 천명했으나, 아직 시장이 전망하는 수준의 긴축을 보여주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시장에서 연내 연준은 6∼7회 기준금리 인상, ECB는 2회 인상을 예상하는 것과는 괴리가 적지 않다.
블룸버그는 과거 서구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까닭에 이들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2010년대 각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게 된 토양이 된 것처럼 역사적 사례를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효과를 낳았다며 이런 점진적인 긴축 전략이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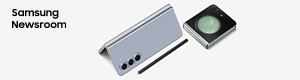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어린이 행복도시, 서울’ 퍼포먼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39/image.jpg?w=60&h=51)
![[왼쪽부터 이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공동위원장(전 관광공사사장) ,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상임위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대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46/1-1.jpg?w=60&h=51)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부도를 덮었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석가모니 가사를 벗기면서 제막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76/image.jpg?w=60&h=51)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워크숍, 안성굴암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29/image.jpg?w=60&h=51)
![[KOREA NEW WAVE 7, 벨기에에 펼치는 K-Art의 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99/korea-new-wave-7-k-art.jpg?w=60&h=51)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67/image.pn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