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증권사를 넘어 은행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가 전날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팀을 보낸 것.
이는 CD 담합 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CD 금리를 결정하는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까지 CD를 발행한 은행들에 조사팀을 파견해 이들 은행의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자금담당 부서를 통해 최근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일물 CD 금리는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기준금리로 이용되고 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평균 내 발표하지만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현재 기업대출의 56.1%, 가계대출의 23.6%가 CD 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살찌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으며,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5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은행들은 CD 발행 물량이 거의 없고 CD 금리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은행을 무리하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공정위 왜 은행 조사 나섰나?
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한 번씩 10개 증권사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CD 금리를 통보받아 최고, 최저 금리 2개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고시금리를 결정한다.
표면상으로는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증권사들을 먼저 조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CD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CD 금리는 CD의 거래금리나 호가로 결정되지만, 그 거래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발행금리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D 거래금리는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거래금리로 굳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로서는 CD를 발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CD 금리를 낮춰서 발행할 이유가 없다.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49.1%는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이다. 이는 3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의 금리가 CD 금리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CD 금리를 0.5%포인트만 높게 형성해도 은행들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질 때 CD 금리는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석 달 동안 연 3.54%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금리는 금융기관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루빨리 대안금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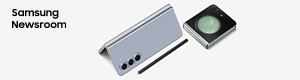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부도를 덮었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석가모니 가사를 벗기면서 제막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76/image.jpg?w=60&h=51)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워크숍, 안성굴암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29/image.jpg?w=60&h=51)
![[KOREA NEW WAVE 7, 벨기에에 펼치는 K-Art의 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99/korea-new-wave-7-k-art.jpg?w=60&h=51)
![안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14/3.jpg?w=60&h=51)
![[호흡_시리즈8, 53x53cm, 한지에 혼합재료, 2024]](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737/_-8-53x53cm-2024.png?w=60&h=51)







![KGMC의 9M급 42인승 전기 버스 [KGMC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04/kgmc-9m-42-kgmc.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