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와 유럽·미국 등 선진국 간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탈동조화 현상이란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8일 한국은행은 `중국 제조업의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유럽.미주 선진국 경기의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아시아 신흥시장국과 주요 선진국의 탈동조화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졌다. 지난해 미국과 유로지역 경제는 -2.6%와 -4.1% 성장했지만, 중국과 인도는 9.1%와 7.4%씩 성장했다.
최근 미국·유럽 경기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 경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탈동조화를 보여준다.
한은은 특히 중국 경제가 분업화.전문화.개방화에 힘입은 `효율 주도형' 성장에서 이제는 인적.물적 자본의 개선과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얻는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질적인 선진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중국은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경제의 외연을 키우는 것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대신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유학생 귀국이 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생산성을 높이는 내적 성장에 주로 기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 노동과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2010∼2015년 66%에서 2016∼2020년 59%로 감소하겠지만 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자국 특허·기술 우대와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수시장에서의 내외국 기업 간 차별 등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으로 인해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국제 분업의 하부에 위치했던 중국이 가치사슬의 전범위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을 다른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한편,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어 아세안 시장 등에서 한·중·일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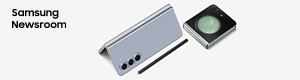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강승민이 물방울 작업을 특수 제작한 유리로 바탕 작업한 후 이쑤시개로 하나하나 배치하여 완성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626/image.jpg?w=60&h=51)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LG에너지솔루션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613/46-lg.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