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의 법정다툼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여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한 1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3전 3패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은행을 상대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데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소송 기간에 중도금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대출 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신용관리'가 필요한 점도 소송의 이유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기관이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재판 도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지만 소송이 끝나면 밀린 `연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은행이 상세하게 알리도록 최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소한 이후 자칫하면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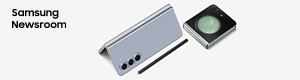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소프라노 인수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42/image.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4/image.jpg?w=60&h=51)
![[2024 한국특성화고총동문연합회 총회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3/2024.jpg?w=60&h=51)
![[마음환승센터,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 미고사 21일 노트를 나눠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자비나눔 행사 진행]](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310/21.jpg?w=60&h=51)







![테라파워의 4세대 SMR '소듐냉각고속로' 조감도 [HD현대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548/4-smr-hd.pn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