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적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준 적이 있었다. 얼마되지 않은 빚에 짓눌려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빚의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는 측면이 적지 아니하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97년 대선에서는 지난 두 차례 내세웠던 ‘농가부채 탕감’을 ‘농가부채 경감’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유의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자의 수가 83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경제능력을 어떻게 일일이 심사할지 의문이다.
빚 탕감정책의 시행이 쉽지 않은 것은 채무자들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도 있다. 빚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견뎌 낸 사람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갖 노력을 다하여 빚을 갚은 사람들 중 누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1100만원을 빚진자 중에서 정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와 900만원을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자 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번 빚 탕감조치로 인하여 국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앞으로도 소액의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정부가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될 소도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선의로 행하는 빚 탕감 정책은 그것이 서민들의 삶에 비치는 햇빛 못지않게 생활방식에 드리워지는 그늘도 적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체제가 국민의 자유와 책임이 강조되는 민주주주의체제이지 국가의 전면 개입과 지원이 강조되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우선 듣기 좋은 정책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사회경제적 역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깊이 고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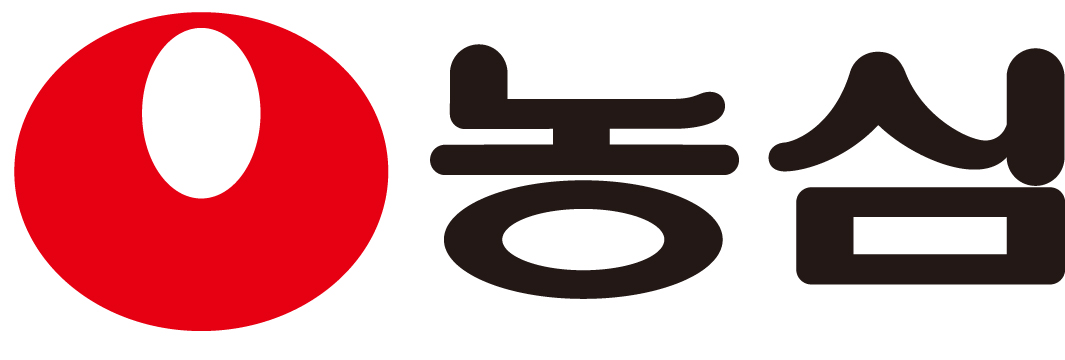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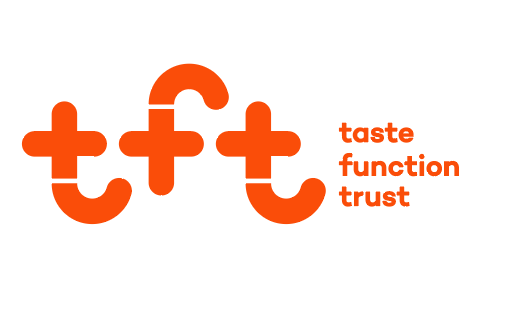
![[‘ART OF 8 WITH JAZZ’ 전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725/art-of-8-with-jazz.png?w=60&h=51)
![[서울교육삼락회 회원들이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710/image.jpg?w=60&h=51)
![[안성 파라밀 요양원 나눔 봉사하는 미고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712/image.jpg?w=60&h=51)
![[포스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604/image.png?w=60&h=51)
![[김병구 작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618/image.jpg?w=60&h=51)







![네이버클라우드와 컨버지의 필리핀 DX 사업 협력 MOU 체결식 [네이버클라우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736/dx-mou.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