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상생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못 이겨 급하게 내놓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최근 ‘1차 협력업체 확대’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1차 협력업체가 되면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게 되어 현금결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진다. 하지만 그 하위 업체들에겐 ‘딴 나라’얘기다. 2, 3, 4차 협력업체들에겐 1차 협력업체가 ‘갑’이다. 이들이 이번에 1차가 못되면, 오히려 갑만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은 그나마 관심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심해졌다. 게다가 기존의 1차 협력업체들도 경쟁 심화를 우려해 ‘1차 협력업체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는 그나마 뾰족한 수도 없다.
8일 발표한 것이 ‘우수리 기금 확대운영’이다. 기본급 중, 1천원 미만을 공제해 모인 금액으로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오던 것을 상여금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매출이 대기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한 분기 매출이 14조를 넘어서는 대기업이 “우린 상여금에서도 몇 백 원씩 모은다”며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치졸하다 못해 보는 이가 안타까울 정도다.
이런 미봉책들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들이 바뀌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한 중소기업이 여러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한 원청업체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힘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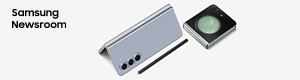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삼성물산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0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