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신 '환율'을 선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결국 기준금리를연 2.25%로 동결하기로 해 3개월째 같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환율 하락 등 다른 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상기후에 최근 태풍 곤파스, 추석연휴가 겹치며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 물량은 달린 탓에 주요 밥상 채소의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이상 급등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를 크게 웃도는 3.6%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다소 채소값이 진정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시중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해 채소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들의 물가인 상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미국의 양적완화책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까지 내려왔다. 일본정부도 최근 4년만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되돌리고, 엔화 절상을 막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라는 '역주행'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금리를 올릴 경우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다.가뜩이나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기전망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개적으로 시장개입에 참여 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간 향후 거센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위협 받을 수 있어 조만간 금리인상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은이 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2월 중 금리를 올리는 것은 효과가 낮아 시장에서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결국 내 달 금리인상론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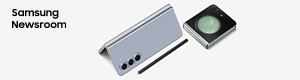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삼성물산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0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