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국내 대학 학부생이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우주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밝혀내고, 그 결과를 천문학ㆍ천체물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3학년 장민성 씨(22)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씨가 `초기 우주 우주먼지의 기원`에 관해 작성한 논문은 지난 1일 천문·천체물리학 분야 최상위급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레터(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실렸다. 학부생이 주도한 연구가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천문·천체물리학분야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물리천문학부 3학년 장민성 학생(제1저자)과 임명신 교수(교신저자)가 주도하고, 미국·대만 등의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팀이 우주 초기(우주 탄생 후 10억년 이내)에 만들어진 우주먼지가 초신성(超新星; supernova) 폭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주먼지는 지구먼지처럼 우주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물질이다. 이제까지는 진화 과정에서 늙은 별이 천천히 죽으면서 생긴다고 알려졌으나, 갓 생성된 10억년가량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우주에도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먼지가 존재하는데, 이 우주먼지는 일반적으로 10억년 이상의 진화를 거친 늙은 별들의 잔해로부터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뒤 채 10억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우주먼지가 만들어졌는지, 그 초기 우주먼지의 생성 원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었다.
장민성 씨 등 연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천체 현상인 '감마선 폭발(Gamma Ray Burst)'을 활용했다.
장씨는 2007년 감마선 폭발이 확인된 감마선폭발천체(GRB 071025)를 미국 애리조나주 레몬산에 있는 1m 망원경(천문연구원 소유)으로 관찰하고 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으로 초기 우주먼지 연구를 시작했다.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이 죽으면서 폭발할 때 나오는 강한 빛이 우주먼지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빛을 흡수하는 우주먼지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나타난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특히 이번에 관찰된 스펙트럼의 특징으로 미뤄, 'GRB 071025' 근처의 우주먼지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은하에서 발견되는 우주먼지(주로 규소)와 달리 탄소·황화철·마그네슘 등 다양한 성분으로 이뤄져 있었다.
장씨 등이 연구한 천체 GRB 071025는 지구에서 약 127억 광년 떨어진 천체로, 이 정도 거리의 우주에는 우주의 초기 환경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우주 탄생 이후 10억년 이내 생성된 초기 우주에도 우주먼지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입증된 셈이다.
장씨는 "감마선폭발천체를 등대처럼 사용해 먼 우주 모습을 관찰해보니 최근 우주와 다른 특이한 색깔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인된 다양한 우주먼지 성분을 근거로, 연구진은 이 초기 우주의 먼지들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매우 무거운 별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구에서 127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 현상에서 이런 색깔의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 우주먼지(규소)가 아닌 초신성(이전까지 어두웠던 항성이 갑자기 폭발해 밝아지는 현상)에서 만들어진 우주먼지(탄소, 마그네슘 등)가 필요하다. 즉 초기 우주먼지는 초신성이 갑자기 죽으면서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장민성씨는 "그동안 초기 우주의 경우 우주먼지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초기 우주에도 우주먼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 우주먼지와는 전혀 달리 초신성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며 "앞으로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레몬산 망원경으로 관찰한 감마선 폭발 천체 'GRB 071025'(녹색 동그라미). 가시광선(위쪽) 및 근적외선(아래) 촬영>
 |
|
|
<우주먼지 생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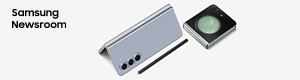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삼성물산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0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