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2000년 중반 이후 서비스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서비스 시장에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서비스 계열사들이 내부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핵심사업 비관련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들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마저 장악할 경우, 중소서비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서비스업 진출 동향'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집단의 서비스 계열사 376개의 2010년 매출액은 342조653억 원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총 생산의 55.6%에 달했다.
또 이들 대기업 집단의 서비스 계열사들은 진출 초기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제조 계열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 분야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사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해 이들 서비스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제조 계열사의 영업 이익률을 웃돌고 있다.
제조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을 제외하면 모두 10%를 밑돈데 반해 서비스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2008년 10%를 상회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15%에까지 근접했다.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서비스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2004년 이후 제조 계열사의 이익률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2004~2008년에는 두 사업부문간에 큰 격차가 없었지만, 2009년과 2010년 제조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5~10%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계열사는 같은 기간 각각 약 20%와 25%를 보이며 크게 상승했다.
철강산업을 주도하는 포스코 역시 2008년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서비스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제조계열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산업의 대표 기업인 LG전자 역시 서비스 계열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제조 계열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서비스 계열사들의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률은 대부분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특히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면서 계열사나 관계사 간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해 사회 문제로 부상할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80%에 이르며, LG서브원의 내부거래 비중은 76%, 삼성SDS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63%, SK C&C의 2010년 내부거래 비율 역시 63%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홍보,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업 등에서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대 그룹의 신규 계열사 가운데 서비스업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 기간에 신규 계열사 237개 가운데 서비스업은 149개, 제조업은 88개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규모별 생산지수에 따르면 2005년 생산량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지난해 2분기 163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생산지수가 131.3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 MRO 업체의 매출액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펴낸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 모색’에서 “2001~2010년 40대 민간 기업집단의 신규 편입 계열사의 제조업 진출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 진출비중은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규 편입 계열사가 그룹당 4.38개인데, 동일 업종(1.21개)를 제외한 대부분(84.5%)이 도소매업 등 광의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분석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 배경을 “제품 생산만으로는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돼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근 서비스계열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제조계열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경쟁적인 사업 다각화는 대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 업종별 시장구조와 내부거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시장마저 대기업 집단이 지배할 경우 서비스 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창업을 저해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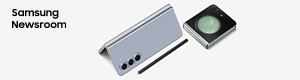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삼성물산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0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