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자본·노동 등 요소 투입형에서 `생산성 주도형'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한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한 `한국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주도형 경제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총소득이 연평균 3.41% 늘어난 가운데 자본과 노동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소득증가 기여도는 1.68%포인트에 그쳤으나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는 2.04%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란 노동·자본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득증가 부분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술진보, 규모의 경제, 효율성 변화, 경기순환 효과 등의 영향을 포괄한 것이다.
보고서는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을 분해하면 노동·자본 투입의 증가가 실질소득 증가에 대부분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2006년부터 생산성 증가가 소득 증가를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인구증가 둔화, 자본축적의 진전 등으로 인해 점차 자본·노동 등 요소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생산성 향상이 앞으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순소득은 연평균 6.02% 증가했다.
실질 순소득은 실질 총소득에서 실질감가상각을 뺀 것으로, 보고서는 실질감가상각이 연평균 1.3%포인트씩 실질 순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감가상각 외에 실직소득의 증가를 제약한 요인은 교역조건 악화가 대표적으로, 교역조건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역조건 악화 요인이 실질소득의 증가를 제약해왔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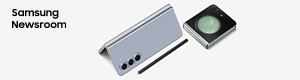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양병구 작가 제53회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4/53.jpg?w=60&h=51)
![[제83회 차홍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502/83.jpg?w=60&h=51)
![[동국대 자비명상지도사 2급 과정 30기 수료식 단체 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97/2-30.jpg?w=60&h=51)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삼성물산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0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