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릴리는 캐나다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2010년 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다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부모는 릴리를 국제학교에 보낼수도 있었지만 보통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며 엄마의 나라에 대해 잘 아는것이 더 좋을 거란 생각에 일반 학교에 진학시켰다.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째인 릴리에게 김치를 먹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 모르는 한국말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질문이 많은 것도 이해할 만 한 일이다. 하지만 릴리의 어머니는 학교가 그 정도의 관용도 베풀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원망을 감추지 못했다. 릴리는 선생의 주도로 반 아이들에게 '바보 삼창'을 들었다. 교사로부터 '바보', '등골 빼먹는 아이'란 조롱도 들었다. 어린 여학생이 그 말로 상처를 받았음은 명백했다. 밝은 성격이던 릴리는 날로 어두워져 갔다.
릴리의 부모가 원한것은 그저 교사의 진심어린 사과였다. 하자민 리리의 어머니는 "사과에 벗(BUT)을 붙이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며 "다만 제 교육적 의도는 배제된 채 언어적 표현의 부적절함만 부각되는 상황에 저도 몹시 힘이 듭니다"라 덧붙이는 교사의 태도에에 분개했다고 밝혔다. "치료비를 제시하면 최대한 고려해 보겠다"는 교사의 말에서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릴리의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단 생각에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대처는 릴리의 부모를 화나게 할 뿐이었다. 학교측 징계의원회 소집 통보를 11시로 잡고, 겨우 1시간 전인 10시에 학부모 참석 통보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학부모는 많지 않았다. 릴리의 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급히 학교로 찾아왔으며, 고작 5명만 참석한 학부모 회의에서 결국 담임 교체 결정이 내려졌으나 징계는 기약이 없었다.
교장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모르는 척, 못 듣는 척을 했고, 교감은 전화와 문제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아동복지기관,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돌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과 법은 없었다.
릴리의 어머니는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심리치료를 요구하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당부를 했으나 그 역시 지지부진했고 부모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3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릴리는 급우 남학생에게 "왜 나대느냐", "학급 분위기를 해치는 난리를 치느냐"는 비난을 들었고 결국엔 어머니를 껴안고 엉엉 울었다. 졸업 후 진학하는 중학교도 현재의 동급생의 상당수가 같이 진학해 부모의 걱정은 달래지지가 않는다.
A교사는 결국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기존 구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무원 지위가 박탈되었던 법도 벌금형을 받으면 교직이 박탈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막말'이 방시되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언어 폭력 사례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릴리양 사건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병폐를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다문와 가정 자녀 등 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책임의 회피, 집단 주의적 문화로 인한 이지매 현상 등 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름뿐인 권익보호 시스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릴리의 어머니는 "법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 너의 권리는 항상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스텝을 밟아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시스템 실패죠. 요즘은 고국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온 게 잘못이 아니었는지 후회도 돼요"란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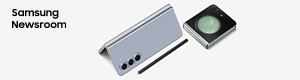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어린이 행복도시, 서울’ 퍼포먼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39/image.jpg?w=60&h=51)
![[왼쪽부터 이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공동위원장(전 관광공사사장) ,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상임위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대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46/1-1.jpg?w=60&h=51)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부도를 덮었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석가모니 가사를 벗기면서 제막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76/image.jpg?w=60&h=51)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워크숍, 안성굴암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29/image.jpg?w=60&h=51)
![[KOREA NEW WAVE 7, 벨기에에 펼치는 K-Art의 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99/korea-new-wave-7-k-art.jpg?w=60&h=51)







![파주시 메디컬 클러스터 조감도 [파주시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151/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