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소득에 비해 좁거나 과도하게 비싼 집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임차 가능지수 및 분포도를 활용한 가구 규모별 부담의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임차 가능지수는 전국 평균 5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74였다.
주택임차 가능지수는 0∼200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지수가 100이면 각 가구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적정한 집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처럼 임차 가능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현재 과도한 주거비 지출을 하고 있거나, 가구 형태에 어울리는 적정 면적보다 좁은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도 아니면 지금은 적당한 면적과 임대료에서 살고 있지만, 계약 시점보다 임대료가 올라 재계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반면 3인 가구는 전국 평균이 133으로 1∼4인 가구 중 임차 가능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115)과 비수도권(160) 모두 100을 넘어 소득이나 자산보다 여유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인 가구는 전국 평균의 경우에는 101을 기록 기준점을 웃돌았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88로 100 이하였다. 4인 가구는 전국 평균이 121이었고 수도권(103)과 비수도권(151) 모두 100을 넘었다.
임차 가능지수를 과거부터 보면 2012년 이후 2∼4인 가구는 완만하지만 상승하는 추세였다. 저금리 및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 임대 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2012년 50에서 2013년 64로 오른 뒤 다시 2014년 53으로 떨어졌고 그 뒤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임차 가능지수가 낮은 것은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소득이나 자산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7.87%로 1∼4인 가구 중 가장 비중이 크지만, 이들의 자가 비율은 32.5%로 60%가 넘는 2∼4인 가구에 비해 낮다. 그만큼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반면 1인 가구는 2∼4인 가구에 비해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았다.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상당한 임차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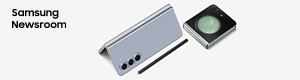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2025 월드아트엑스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26/2025.jpg?w=60&h=51)
![[신동권 화백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708/image.jpg?w=60&h=51)
![[안창수 화백이 지난 연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제1회 양산시 예술인상을 수상했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91/1.jpg?w=60&h=51)
![[사색의향기 바른댓글실천연대, 2024 송년회 및 ‘행복’ 주제로 백일장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41/2024.jpg?w=60&h=51)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펭귄 솔루션스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SK하이닉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48/sk-sk-ai-sk.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