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규모의 '매머드급' 조선사가 나오게 된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과 노조 반발, 독점 논란 등이 인수 확정 후 우려되는 부분이다.
31일 조선업계와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천114만5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점유율 13.9%)의 수주잔량을 보유했다.
2위는 584만4천CGT(7.3%)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으로,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총 수주잔량은 1천698만9천CGT, 점유율은 21.2%까지 각각 늘어난다.
이는 3위인 일본 이마바리조선소 수주잔량 525만3천CGT(6.6%)의 3배가 넘는 규모다. 5위인 삼성중공업[010140](4천723CGT)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한다.
도크(선박을 건조하는 대형 수조) 수만 놓고 봐도 현대중공업(11개)과 대우조선(5개)이 합쳐지면 총 16개가 돼 규모 면에서 경쟁상대가 사라진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얻을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한국 조선이 선점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종 수주전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조선업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국가별 연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2천860만CGT)이 2017년(2천813만CGT)과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한국이 큰 격차로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던 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일감을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클락슨 집계를 보면 작년 1∼11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총 65척 가운데 국내 대형 3사가 수주한 실적은 56척(86.2%)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25척, 대우조선해양이 17척, 삼성중공업이 14척을 각각 수주했다.
단순 계산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질 경우 전 세계 LNG선 발주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확보할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LNG선 발주 전망이 긍정적인 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요인으로 꼽힌다.
클락슨은 미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정책 등으로 LNG의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난 동시에 LNG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올해 LNG선 발주량이 69척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0∼2027년에는 연평균 63척의 LNG선 발주가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저가수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이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국내 3시간 벌어졌던 출혈 수주 경쟁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선가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1, 2위 조선사가 합쳐지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남기면서 수주량을 함께 늘리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우조선이 쇄빙선,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현대중공업그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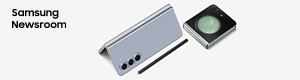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2025 월드아트엑스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26/2025.jpg?w=60&h=51)
![[신동권 화백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708/image.jpg?w=60&h=51)
![[안창수 화백이 지난 연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제1회 양산시 예술인상을 수상했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91/1.jpg?w=60&h=51)
![[사색의향기 바른댓글실천연대, 2024 송년회 및 ‘행복’ 주제로 백일장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41/2024.jpg?w=60&h=51)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펭귄 솔루션스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SK하이닉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48/sk-sk-ai-sk.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