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이어진 전세값 상승세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1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구입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뜻으로 특히 올 들어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5.0%로 지난해 2월 52.3% 기록한 이래 15개월 연속 상승하며 2006년 11월 55.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세수요보다는 매매가격 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전세수요는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수요가 개입된 주택매매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줄고 집값 하락기에는 비율이 상승하게 마련이다.
또 전세가 비율 상승은 매매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도 한다. 전세와 매매가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도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5.7%를 기록한 이래 2001년 68.9%, 2002년 65.3%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0.5%로 떨어진 전세가 비율은 2005년 57.1%, 2006년 54.7%, 2007년 54.0%, 2008년 5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2.3%까지 떨어진 전세가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12월 53.9%까지 회복됐다.
특히 올 들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비율도 매월 0.2%p 꼴로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전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매매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의 전세가 비율이 7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71.3% ▲경북 70.2% ▲울산 69.7% ▲대전 68.1% ▲제주 67.9% ▲대구 67.2% ▲부산 67.1% 등의 순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41.8%)과 인천(44.6%), 경기(44.5%)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서울 강남의 전세가 비율은 39.6%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주택수요가 실거주 목적 위주로 구성돼 있고 매매가격도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를 훌쩍 넘는 단지도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시세조사에 따르면 부산 남구 감만동 현대1차 79.33㎡(공급면적)의 경우 매매가가 6100만 원인데 비해 임대 상한가는 5550만 원으로 전세가 비율이 91%에 달했다.
대구 북구 관음동 한양수정 79.33㎡도 매매가는 7400만 원인 반면 임대 상한가는 6500만 원에 달해 전세가 비율이 88%을 기록했다. 또 92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된 광주 서구 주은모아 76.03㎡도 임대 상한가는 8000만 원으로 전세가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 비율이 60%대를 넘어섰다. 구로구 구로동 대림2차우성 72.72㎡의 매매가는 2억1000만 원으로 임대 상한가가 1억3000만 원에 형성돼 전세가 비율이 62%로 조사됐다.
또 성북구 정릉동 중앙하이츠 82.64㎡는 매매 1억8000만 원에 임대 1억2000만 원으로 전세가 비율이 67%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세가 비율의 오름세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전세가 비율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는 시장이 상승기일 때나 통하고 지금처럼 약세일 경우는 먹혀들지 않는다"며 "경기회복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매매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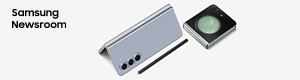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유니크한 3명의 아티스트가 펼치는 드로잉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41/3.jpg?w=60&h=51)
![[김병구 초대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033/image.jpg?w=60&h=51)
![[2025 월드아트엑스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26/2025.jpg?w=60&h=51)
![[신동권 화백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708/image.jpg?w=60&h=51)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 [삼성전자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23/ai.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