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탈락한 '정규직의 꿈' 돈이면 'OK'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던 A씨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나 정규직 '발탁채용'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회사 내에서는 "돈을 써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A씨도 결국 사내 채용브로커를 찾아 나섰고 외숙모가 한국지엠 내 회사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외숙모에게 부탁해 채용브로커로 활동하는 회사 내 세탁소 운영자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예상대로 뒷돈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천300만원을 외숙모에게 건넸다. 그의 외숙모는 2천300만원을 챙겼고 나머지 2천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도급업체 소속 B씨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함께 일하는 도급업체 소속 동료들은 "돈을 써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내에서 활동하는 취업브로커 가운데 성공률이 높다는 인물을 운 좋게 접촉했다. 7천만원을 달라고 했다. B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이모에게 사정한 끝에 수년간 청소 일을 해 모은 돈을 빌려 브로커에게 건넸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10년 가까이 꿈꾸던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이 됐다.
불법이지만 돈을 써서 한국지엠 정규직이 되면 도급업체에서 받던 연봉이 보통 2배 가까이 올랐다.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이 됐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다. 정규직으로 몇 년 일하면 채용브로커에게 건넨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검찰 수사결과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맺은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자 잇속을 챙기며 장기간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내 브로커는 노조 핵심간부에게 금품 일부를 나눠주며 취업자의 이름을 넌지시 알려줬다.
노조 간부로부터 청탁자의 이름을 전달받은 회사 전략담당 상무는 노사부문 부사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전략담당 인력관리팀에게 합격을 지시했다.
인력관리팀은 학교 성적, 도급업체 부서장의 추천 점수, 군필 가산점수, 면접점수 등을 모두 합한 청탁자의 최종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치면 서류에 적힌 점수를 인위적으로 고쳐 합격권 안으로 밀어 넣었다.
2012년 상반기 발탁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한 불법 취업자는 서류전형에서 학교 성적 점수가 49점에서 69점으로 뛰어올랐고 전체 채용자 중 순위도 36등에서 합격선인 15등으로 상승했다. 인력관리팀이 조작한 결과였다.
이 채용자는 면접심사에서도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아 91등인 순위가 합격선(52위) 내 51위로 껑충 뛰었다.
검찰이 수사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채용비리 관련자는 전·현직 임원 등 사측 5명과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31명(9명 구속기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니 구조적인 비리의 벽에 막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지엠 도급업체의 많은 근로자가 자꾸 눈에 밟혔다"며 "앞으로도 채용과 관련한 기업 내부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첩보를 수집해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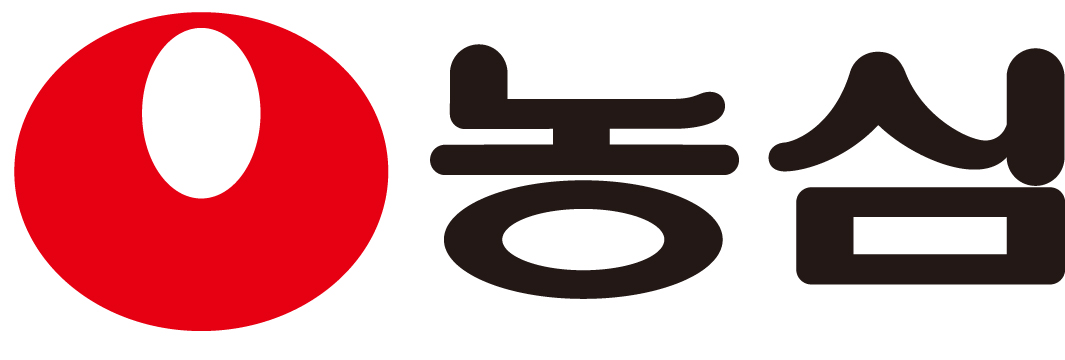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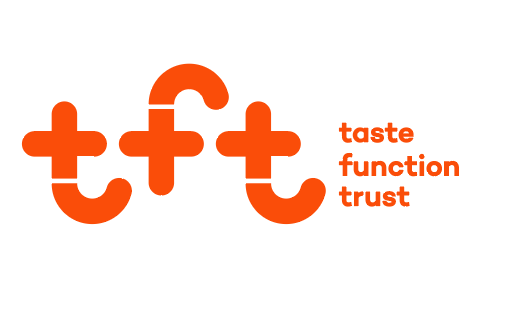
![[이열작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533/image.jpg?w=60&h=51)
![[전진규 작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506/image.jpg?w=60&h=51)
![[홍형표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58/image.png?w=60&h=51)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 성공회 윤종모 주교]](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2465/image.jpg?w=60&h=51)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878454/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