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31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 시공사 투자자들은 6일 용산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컨소시엄 이사회에서 재무사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해 사실상 '사업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사상 최초로 국내 최대 자본으로 추진해온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8조원이라는 막대한 땅값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 2006년 8월에 용산개발사업이 처음 언급되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듬해 2007년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상위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이후부터 수도권 등 일부 개발지역에서 땅값이 폭락해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 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건설사에게도 타격을 입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최대 자본으로 진행되는 용산산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하나둘씩 난색을 표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건설사들의 지급보증으로 PF대출을 받지만 각 건설사가 원래 보유한 PF 보증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이번 사업에 추가 지급보증을 서기 어려워 자금조달 창구도 막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사업을 해도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PF보증을 서겠느냐 PF 보증 규모는 9500만원에 그치지만 이후 임대, 분양 등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8조원의 땅값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1조 5000억원가량 지불한 상황이고 4회로 나눠서 내기로 한 계약금 중 4차분 3억 175억원과 2차 토지매매 중도금 3835억은 아직 미납된 상태이다.
사업중단 위기에 몰리면서 서울시와 코레일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 부지에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서부 이촌동 2200가구를 포함해 통합개발을 원했고 시가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개발 부담을 용산개발사업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자신들이 보유한 땅값을 비싼 값에 팔기위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8조원에 낙찰받았는데 당시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 측은 "용산은 입지가 좋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주빈들의 반발도 심각할 전망이다.
2007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사업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3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그 피해는 더 가중되고 이는 집과 땅을 샀던 일반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먼저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 용산개발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6년까지 정해져 있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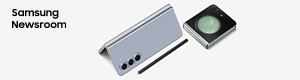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어린이 행복도시, 서울’ 퍼포먼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39/image.jpg?w=60&h=51)
![[왼쪽부터 이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공동위원장(전 관광공사사장) ,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화상임위원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대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046/1-1.jpg?w=60&h=51)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부도를 덮었던 인도 쿠시나가르 열반당 석가모니 가사를 벗기면서 제막하는 모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76/image.jpg?w=60&h=51)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워크숍, 안성굴암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929/image.jpg?w=60&h=51)
![[KOREA NEW WAVE 7, 벨기에에 펼치는 K-Art의 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5899/korea-new-wave-7-k-art.jpg?w=60&h=51)







![신보와 GIST의 지역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MOU [신보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203/gist-mou.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