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건설업계 줄도산의 `뇌관'인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올해 11조원가량 만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 사업장이 약 3조원에 육박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 28조1천억원 가운데 11조원 가량의 만기가 올해 몰려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도래 비율은 평균 39.2%이고, 일부는 만기도래 비율이 50%를 넘는다.
은행들은 침체된 건설경기 탓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가운데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출은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 PF 대출의 약 9%인 2조6천억원이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부실 대출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 PF 대출의 부실이 제2금융권 PF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 제2금융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사에 PF 대출을 하고, 은행이 시공사에 PF 대출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 PF 대출 잔액 18조6천억원도 은행 PF 대출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실제 부실 규모는 2조6천원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PF 공포'가 커지자 종합 지원대책 마련에 나섯다.
금감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부실채권을 사들여 정상화하는 배드뱅크)'의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은행들이 정상화뱅크 사모투자펀드(PEF)에 자본금을 더 출자해 할인 가격으로 각 은행의 PF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A~D 4단계로 평가해 고정이하로 분류된 C·D 등급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과정인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PF 사업장의 워크아웃 가이드라인도 은행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행사 대주단과 시공사 채권은행의 자금회수 원칙, 분양 대금의 분배 기준 등이 담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채권자 간 혼선을 줄이고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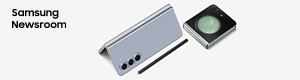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완성된 쌀누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367/image.jpg?w=60&h=51)
![[이참 대표와 이근배 회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265/image.png?w=60&h=51)
![[‘유니크한 3명의 아티스트가 펼치는 드로잉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141/3.jpg?w=60&h=51)
![[김병구 초대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033/image.jpg?w=60&h=51)
![[2025 월드아트엑스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26/2025.jpg?w=60&h=51)







![한화로보틱스의 조리로봇 [한화로보틱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7448/image.jpg?w=288&h=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