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5년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우호적인 기후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가 2008년 이후 처음 흑자를 낼지도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빅5'의 지난해 손해율 평균은 가집계 기준으로 82.1%로 추산돼 전년보다 6.1%포인트나 떨어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서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낮아진 것은 보험사가 그만큼 실속 있게 장사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객에게 돌아간 몫이 준 것이다.
그렇다고 손해율이 높은 것이 고객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험사는 그만큼 적자를 메꾸려고 보험료를 올리게 되므로 적정 수준의 손해율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빅5의 손해율은 손해율 산정 기준이 바뀐 2011년 80.3%에서 2012년 83.6%, 2013년 87.3%, 2014년 88.8%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88.2%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 82.1%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회사별로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손해율이 전년 대비로 8.9%포인트나 내려가 개선 정도가 가장 컸다.
손해율 자체적으로는 삼성화재가 80.7%로 가장 낮았고, 동부화재(81.6%), KB손해보험(81.9%), 현대해상(82.0%) 순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11월까지 손해율이 79.8%였고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7.7%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가 기대된다.
합산비율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회사를 운영하며 들어간 사업비용을 합한 것으로, 합산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흑자를 봤다는 뜻이다.
삼성화재는 연말 기준 사업비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손해율이 11월 말 79.8%에서 12월 말 80.7%로 소폭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으로도 합산비율이 여전히 10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대로라면 2008년 이후 8년 만의 흑자인 셈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가 바뀐 덕분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자로 약관을 개정해 외제차 소유주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외제차로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도록 했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폐지됐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실제 수리했을 때의 비용보다 적게 줄 수 있고 렌트비용도 나가지 않아 보험사로서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할 유인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나 보험 사기단은 미수선수리비를 받고선 차량을 고치지 않고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약관이 개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렌트차량 제공방식과 제공 기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미수선 수리비가 폐지되는 등 제도적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9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가 일부 억제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 2월과 12월에 폭설이 예년에 비해 적었고, 여름에는 태풍 '차바'를 제외하고는 큰 기상 이변이 없었던 점도 보험업계로선 유리한 기후 여건이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태풍 차바 외에 장마나 폭설에 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이 적었다"며 "예년보다 양호한 기상조건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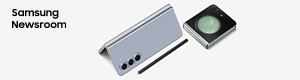
![[2025 월드아트엑스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826/2025.jpg?w=60&h=51)
![[신동권 화백 초대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708/image.jpg?w=60&h=51)
![[안창수 화백이 지난 연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제1회 양산시 예술인상을 수상했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91/1.jpg?w=60&h=51)
![[사색의향기 바른댓글실천연대, 2024 송년회 및 ‘행복’ 주제로 백일장 개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641/2024.jpg?w=60&h=51)
![[등명 스님과 함께 마음환승센터에서 '죽음 명상'을 하는 참여자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491/image.jpg?w=60&h=51)







![LG 스마트 TV에 적용된 엑스박스 게임패스 [LG전자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6907/lg-tv-lg.jpg?w=288&h=168)